
예전에 비하면 일상 속 식민 잔재는 참으로 많이 줄었다. 언어 생활을 보면 쉽게 수긍할 수 있다. ‘벤또’ ‘시보리’ ‘자부동’ ‘노가다’ ‘오야붕’ 등을 자연스레 입에 올렸던 때도 있었다. 물론 아직도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는 않다. 하지만 무심결에 그 말을 썼다가 아차 싶어 손을 입에 갖다 대는 시늉이 늘어난 것을 보더라도 순화된 것만큼은 사실이다. 그런데 힘이 사그라지는 듯 보이는 그 잔재들도 묘한 시기엔 묘한 느낌으로 우리 일상 안에 똬리를 튼다.
멀리 예를 들 것도 없다. 주변의 건설업계에선 너무도 흔한 일이다. 인공지능을 도입하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자 등 설레발을 치다가도 비상한 시간을 맞으면 멀어졌던 그 말들을 꼿꼿이 살려낸다. 비상한 시기가 되면 “뽀찌를 줘서라도 해결하라” “노가다 정신으로 처리해라” “당고우를 해서라도 따내라” 식의 언사가 춤을 춘다. 왜 그럴까.
식민지 시기에 들어온 신식 문물들은 피식민자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식민과 함께 시작된 근대를 맞으면서 접하게 된 신식 기기, 지식, 제도는 피식민자를 즐겁고 편리하게 만들 양으로 도입된 존재는 아니었다. 식민 경영의 편의를 위할 요량이 더 컸었다. 그래서 식민 시기에 우리 곁에 온 신식 문물, 용어들은 지금 우리에겐 힘으로 밀어붙이기, 안 되면 되게 하기의 의미로 남아 있다. 식민 잔재 용어가 평상시에는 열등한 느낌을 주지만 비상한 때는 ‘묘한 힘’을 갖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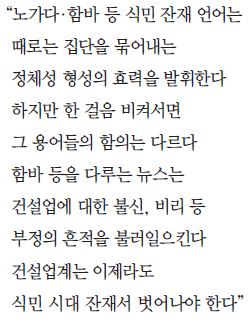
실제로 식민 잔재 용어가 비상한 때 쓰일 경우 내밀하고 막역한 효력을 갖는다. 건설업계에서 스스로를 ‘노가다’라 부르곤 한다. 스스로 낮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도하는 바는 그 반대다. “우리 같은 노가다가 없었다면 한국의 성공이 가능했겠나”라는 말 속엔 자부심이 깔려 있다. “함바에서 끼니를 해결했다”는 소회 속에선 열심히 살았다는 의미를 읽을 수 있다. 그 말을 ‘건설 근로자’, ‘현장 밥집’으로 바꾸어 말하면 결이 살지 않는다. 강한 자부심이나 짙은 소감이 전해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식민 잔재 언어는 언어적 활약을 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집단을 묶어 내는 정체성 형성으로까지 그 역할을 연장한다. 그 용어의 사용 집단 내에서는 그 용어가 갖는 함의에 동의하고 따라야 하는 신비의 효력을 발휘한다. 그 말의 사용자를 한데 묶어 내고 좌고우면하지 않도록 하는 폭력적 힘을 낸다. ‘함바’라는 용어 속에는 같은 밥을 먹던 동지라는 의미도 포함된다. ‘뽀찌’라는 말 속에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관행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당고우’는 담합이라는 속임수가 아니라 다 같이 살자는 운명 공동체라는 절박함을 표하는 의미를 갖는다.
식민 잔재 용어를 유익하게 활용하는 건설업계에서 한 걸음만 비켜서면 그 용어들은 전혀 다른 함의를 갖는다. ‘함바’ 이권을 다루는 뉴스는 대체로 ‘함바’란 말을 통해 건설업계를 내려보려 한다. 부정의 흔적, 불륜의 냄새를 내기엔 ‘함바’란 말 만한 게 없다. 건설업에 대한 불신, 깔봄, 업신여기기에 그보다 좋은 말이 없기에 뉴스는 그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건설업계 내부에서 아끼며 활용하는 잔재가 종국에는 날카로운 비수로 변해 등을 찌르는 셈이다.
‘건설업자’란 용어도 마찬가지다. 부정적인 내용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영락없이 건설업자로 소개된다. 정확한 명칭이 ‘건설사업자’로 바뀐지 2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건설업을 대하는 언론의 태도는 ‘건설업자’ 수준에 머물고 있다.
건설업은 몇십 년 지속되는 보도 관행의 먹이가 되고서도 변화하지 못했다. 사회적 인식도 딱 그 자리에서 멈춰져 있다. 비상한 때 덕을 볼 수 있다는 식민 잔재의 그 달콤한 유혹을 떨치지 못했던 건설업계는 이제라도 식민 시대 바깥으로 탈출을 꾀해야 하지 않을까.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