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쿠샤(Dilkusha).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2길 17을 주소로 둔 등록문화재다. 힌디어로 천국, 꿈의 궁전이라는 의미라 한다. 1923년 미국 통신사의 경성 특파 기자이자, 사업가였던 앨버트 테일러가 지은 집이다. 3·1 독립선언 및 운동을 세계에 한국인의 시선으로 널리 알렸고 그런 탓에 그와 가족은 1943년 미국으로 추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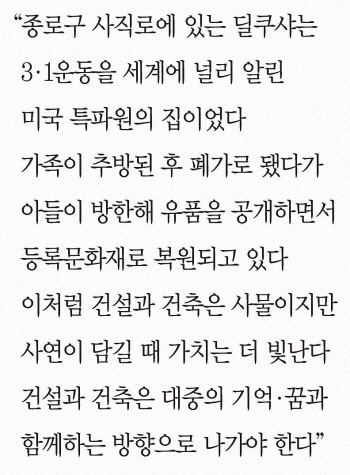
그 가족이 떠난 후 딜쿠샤는 주인 없는 폐가가 됐다. 집 없는 빈민이 차지하고 생활해 무허가 건물마냥 초라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2006년 앨버트 테일러의 아들 부르스 테일러가 방한해 자신이 어린 시절을 그곳에서 보냈다고 증언한다. 그리고 아버지 앨버트 테일러는 양화진 외국인 묘에 모셔뒀다고 밝힌다. 부모님의 사진과 유품을 공개하면서 딜쿠샤는 역사가, 행정가, 시민들의 관심을 끈다. 정부는 이 집을 등록문화재로 설정하고 복원에 나섰다. 2019년 3·1절 100주년을 기념해 시민들에 복원된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딜쿠샤가 세간의 눈길도 끌지 못하던 폐가, 무단점거당한 주인 없는 건물에서 등록문화재가 되고 국경일에 시민의 호기심어린 시선을 챙길 존재가 된 데는 ‘이야기’가 중심 역할을 했다. 1919년 2월28일 서울에서 태어난 부르스 테일러가 한국을 고향으로 여기고, 딜쿠샤를 고향집으로 그리며 살았고, 그의 아버지가 한국의 독립운동을 널리 알렸다는 이야기가 딜쿠샤에 연결되며 딜쿠샤는 그 원래 뜻을 되찾게 된다. 역사적 의미도 보태져 문화재에 이르기까지 한다.
언제부턴가 건설, 건축을 소개할 때 그가 가질 기능이 중심 소재가 되고 있다. 최첨단 소재라느니, 전자동 운영 시스템이라든지, 세계 최고 단열재 사용 등의 기능을 중심으로 소개하기 바쁘다. 그 건물이 들어설 주변과의 관계나 그곳에 들어선 연유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러다 보니 어떤 건설, 건축도 내용이 뻔할 정도로 대동소이하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신기술이 구기술을 눌러버릴 게 뻔하니 언제든 낡고 구식이 될 지름길을 건설과 건축이 소개에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엄청난 규모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의 물량을 건설과 건축에 갖다 붙이려는 야망을 ‘스펙터클 욕망’이라고 부른다. 스펙터클 욕망은 그보다 더 큰 욕망을 만나면 허물어지고 만다. 63빌딩이 롯데빌딩에 최고의 자리를 내준 뒤 마켓팅 포인트를 잃어 허둥대는 게 그 예다. 기능과 스펙터클 욕망으로 덧칠을 한 건설과 건축은 도시의 개성을 뺏고, 시간의 켜를 지우고, 사람의 흔적을 무시하는 환경을 만들어 낸다. 어느 도시나 비슷한 풍모를 지닌 우리네 살림살이의 밑바닥에는 그런 연유가 깔려 있다.
건설과 건축은 사물이지만 사연을 담은 사물일 때 더 가치를 지닌다. 건설, 건축 중에 사연을 갖추지 않은 채 대중의 기억 속에 남은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중의 기억에 아무런 존재 이유도 내비치지 못하는 건설과 건축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이름 그대로 사고파는 상품 사물이 될 뿐이다. 건설, 건축업 종사자들이 자신의 작품에 이름을 새겨두는 것은 사회에 큰 기여를 했음을 드러내는 공공성 가치의 표현 방식이다. 자동 컨베이어벨트 위에 놓인 똑같은 모습의 상품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배경에 맞추어 사람들의 몸과 눈을 편하게 해줄 공공성을 발휘했음을 기리는 방식이다.
3·1절 100주년을 맞아 찾아볼 건축물은 많이 남지 않았다. 아직 제대로 이야기가 붙여지지 않아 우리에게 덜 알려진 건축물도 있을 것이다. 이미 지어진 여러 건축물, 건설물에는 그렇게 잊혔던 이야기를 얹어주어 더 많은 딜쿠샤를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금 진행하고 있거나 앞으로 이뤄질 건설과 건축에도 그것이 놓인 지역과 시간 배경에 맞는 이야기를 덧붙이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건설, 건축 자체만으로 폐쇄적이며 자족적이어선 그 생명이 길지 못하다. 건설, 건축은 그런 점에서 언제나 사회적이며 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일을 잊진 말아야 한다. 대중의 기억과 현실, 그리고 꿈과 함께하는 건설, 건축.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